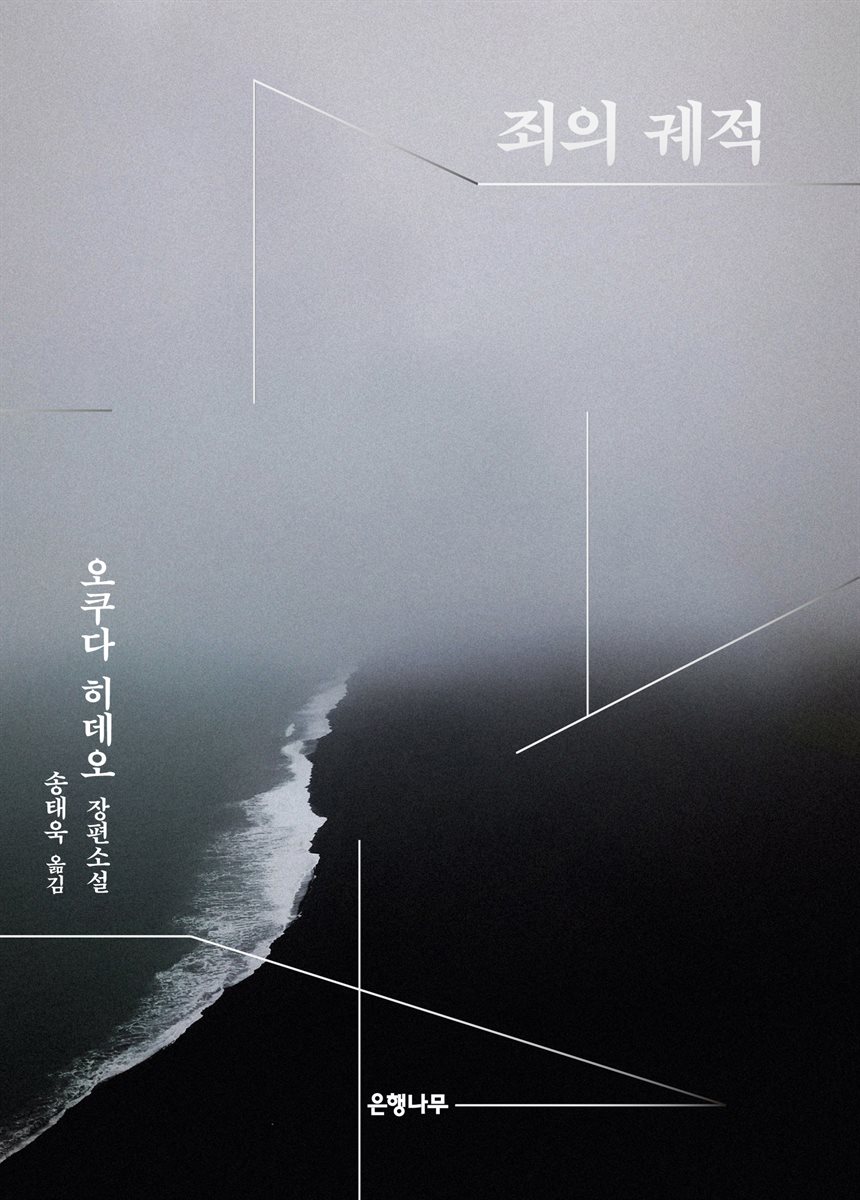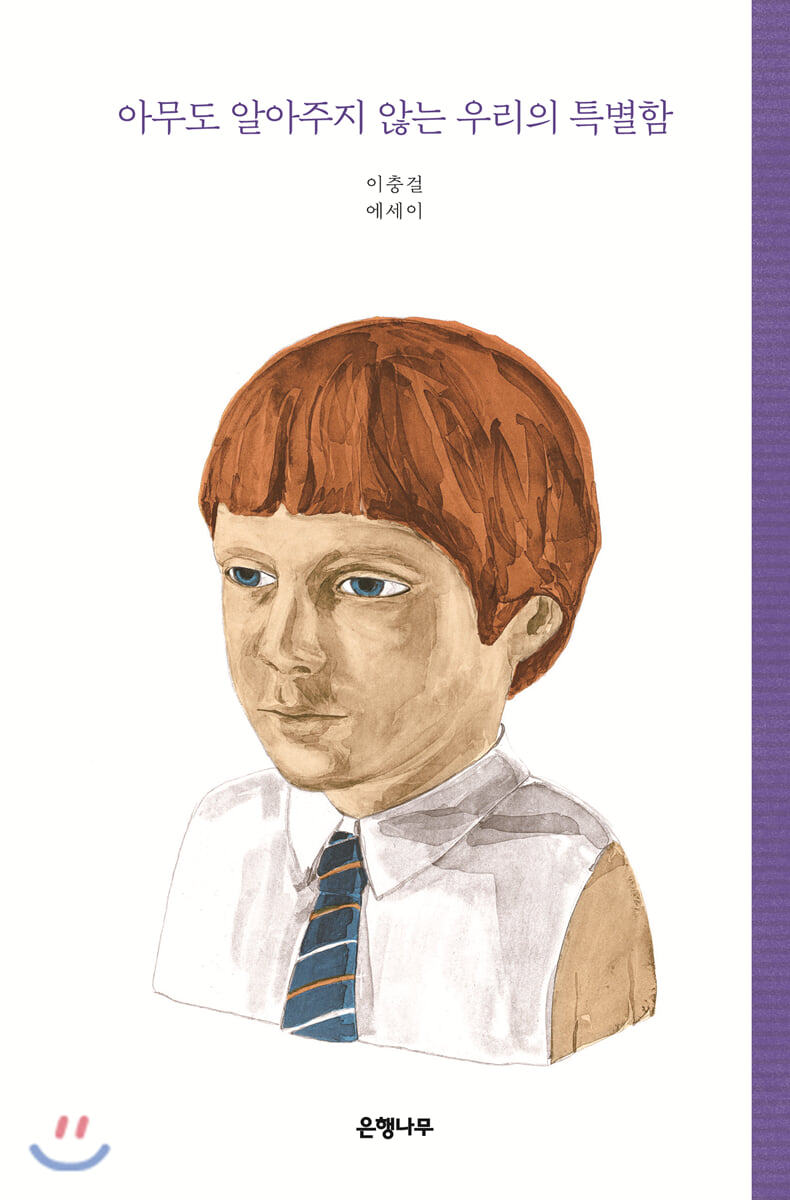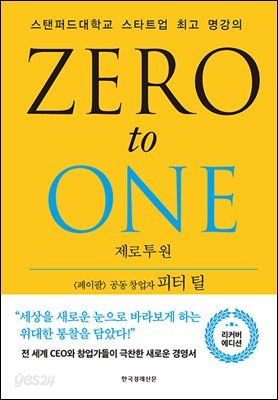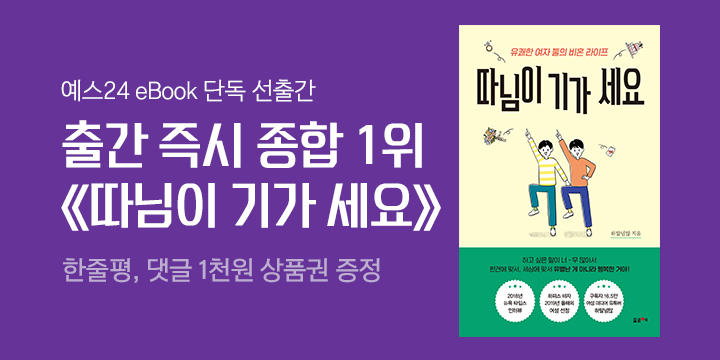|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첫 작품은 어땠을까요? 언론인 생활을 하다 뒤늦게 소설가가 된 김훈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1995년)은 ‘한국문학에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 은희경 (『새의 선물』, 1995년)은 ‘은희경이라는 센세이션’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석제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1994년)의 경우 ‘이것은 소설인가 산문시인가 수필인가’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성석제 작가는 기형도 시인의 절친이었죠. | |
|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995년)와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2002년)은 첫 작품을
통해 ‘젊음’과 ‘트렌디’를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한국형 스릴러의 대표주자 정유정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2007년)은
의외로 풋풋한 청소년 문학으로 데뷔했습니다. 편혜영 (『재와 빨강』, 2010년)과 한강 (『검은 사슴』, 1998년)은 강렬하게
자신들의 문학 세계를 미리 보여줬습니다. 장강명 (『표백』, 2011년)은 ‘전혀 새로운 사회경제적 고발’을, 백영옥
(『스타일』, 2008년)은 ‘한국형 칙릿’을, 정세랑 (『덧니가 보고 싶어』, 2011년)은 ‘한국형 판타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 |
|
김애란 (『달려라 아비』, 2005년)은 25세 작가가 쓴 걸로는 믿기 힘든 작품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고 최은영
(『쇼코의 미소』, 2013년)과 김금희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2014년), 손보미 (『그들에게 린디합을』, 2013년)는
모두 범상치 않은 단편들로 한국문학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두 명의 신성(新星)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2019년)과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2019년)은 각각 ‘우주’와 ‘판교’라는 전혀 이질적인 환경을 무대로
한국문학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