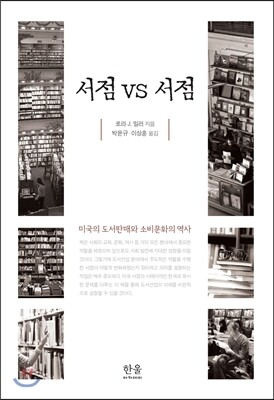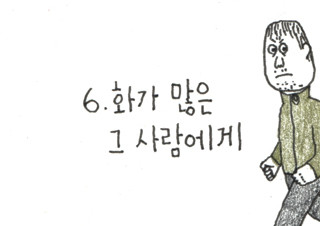○만 부 넘게 팔렸나요?
언스플래쉬
?
?
지난 회 칼럼인 〈내 책은 얼마나 팔리는 걸까〉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하여튼, 내 책이 얼마나 팔린 건지 내가 잘 알지 못하므로 가끔 “그 책 얼마나 팔렸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즉답을 못해 당황한다. 특히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올 때 그렇다.
“그 책 얼마나 팔렸죠? ○만 부 넘게 팔렸나요?”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은 답변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 정확하지 않아도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의 판매부수와 그 이후 증가분을 추정해 “예” 혹은 “아니오”로 그 자리에서 빨리 말해주는 편이 낫다. 답을 하고 나서 영 찜찜하면 출판사에 전화해 제대로 확인한다.
이런 고충을 한 출판계 인사 앞에서 토로했더니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다.
“1만 부 팔렸으면 그냥 5만 부 팔렸다고 해도 돼요.”
그 자리에서는 하하하 그렇군요 제가 정말 순진했네요, 하고 웃고 말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다. 저 말이 농담이야, 진담이야? 그래서 문제의 발언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출판계 인사에게 물었다.
“1만 부 팔렸으면 5만 부가 팔렸다고 말해도 되나요?”
내 질문을 받은 인사는 “그건 좀 아니죠”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1만 부 팔렸는데 2만 부 팔렸다는 정도로는 얘기하죠. 홍보가 되니까.”
이후 나는 어느 책이 몇 만 부가 팔렸다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내가 몸담은 업계가 야바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들 허풍은 조금씩 치는 것 같다.
?
심지어 출판사들도 그런 허풍에 속는다고 한다. 다른 출판사에서 낸 예전 책이 그다지 팔리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는 저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출간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업계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은 얼마나 믿을만할까. 한 전문가가 10만 부 이상 팔렸을 거라며 의미를 부여한 책을 낸 출판사의 대표를 만나 대화한 적이 있다. “그 책 10만 부 넘게 팔렸다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내 말에 대표는 황당해 했다. “누가 그래요? 그거 만 부 나갔는데.” 내 책 판매량이나 나의 수입에 대해 어느 출판평론가가 한 말이 하도 틀려서 기가 막힌 적도 있다. 기초적인 데이터 파악이 이 지경인데 분석이고 대책이 과연 의미가 있나 싶다.
?
나는 정확한 판매 부수를 얘기 않고 ‘몇 쇄 찍었다’고 눙치는 관행도 불만이다. 나만 해도 초판 1쇄를 1만 부 발행한 적이 있는가 하면, 1인 출판사에서 500부로 시작한 적도 있다. 증쇄할 때에는 5000부를 찍기도 하고, 1000부만 추가하기도 한다. “4쇄를 찍었다”는 말은 몇 만 부가 팔렸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직 몇 천 부 수준인 걸 수도 있다. 출간 한 달 만에 몇 쇄를 찍었다는 말은 보통 독자 반응이 열렬했다는 선전 문구로 사용하지만, 다르게 보면 해당 출판사가 초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
그런데 ‘4쇄 찍었다’는 말을 ‘1만 부를 찍었다’고 바꿔도,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몇 부가 팔렸는가? ‘1만 부를 찍었다’와 ‘1만 부를 팔았다’는 다른 말이다. 출판사에서 파악하는 수치는 출고량에서 반품량을 뺀 순출고량이다. 순출고량이 1만 부일 때 거기에는 그 시각 현재 도매상에 있는 서적도 있고, 서점 창고에 있는 도서도 있고, 매대에 진열돼 있는 책도 있고, 반품하거나 폐기할 예정인 물건도 있다.
이러니 출판계가 편의점이나 분식집보다 못하다는 푸념이 나온다. 모든 편의점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분식집도 포스(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기가 있다면 그렇게 한다. 그런데 출판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 한국에서 어떤 책을 실제로 사서 집에 가져간 독자가 그 순간까지 총 몇 명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책 저자와 출판사를 포함해서.
?
국내 2위 출판 도매 업체였던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게 불과 2년 전이다. 주먹구구식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한 송인서적은 자신들이 가져온 책이 서점에 있는지 창고에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 송인서적과 거래한 출판사들도 판매와 유통 정보는 깜깜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책이 다른 책보다 더 많이 팔렸는지 아닌지를 베스트셀러 순위로 가늠하는 일조차 힘들다. 크고 작은 서점에서 팔린 전국적인 도서 판매량 순위를 집계하는 기관은 없다. 여러 대형 서점에서 각각 주간 판매순위를 발표하지만 서점 규모도 다르고 잘 팔리는 책의 종류도 다르다. 심지어 서로 기준도 다르다. 어느 서점은 예약판매를 순위에 포함시키고, 어느 서점은 지난 4주간의 누적판매량을 그 순위에 반영한다.
정부는 도서 판매량과 재고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을 2021년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판사, 도매업체, 서점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도 있는 모양이다. 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뒤에 생길 일들이 궁금하다.
?
어느 소셜미디어 스타의 구독자들이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지가 검증될까?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오랜 기간 소리 없이 꾸준히 팔리는 좋은 책의 저자들이 기회를 더 얻게 될까? 언론과 평론가들이 상찬한 작가의 판매량이 시원찮은 것으로 밝혀져 다 같이 민망해지는 건 아닐까?
독서 문화의 베스트셀러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까, 약해질까? 작은 출판에 관심 있는 이들은 예측분석을 할 수 있게 돼 모험을 더 많이 벌일까, 아니면 이 땅의 척박함을 확인하고 몸을 사릴까? 값싼 기획물은 늘까, 줄까? 출판사는 사재기 유혹을 더 느끼게 될까, 반대일까? 장기적인 영향과 별도로 단기적인 충격이 크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빠지다 보면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 책을 쓰고 파는 일은, 예컨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걸까? 어떤 시스템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합리성은 효율성으로, 효율성은 획일성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걸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께는 사회학자 로라 J. 밀러의 ?『서점 vs 서점』 을 추천한다. 미국 도서판매업의 역사를 다루면서 문제의식을 현대의 소비문화 전반으로까지 확장하는 책이다.
?
서점 vs 서점로라 J. 밀러 저 / 박윤규, 이상훈 공역 | 한울아카데미
서점의 상업화 과정, 체인서점과 독립서점 간 갈등, 서점 직원의 노동과 독자의 서점 이용 등 폭넓은 범위의 쟁점을 다루며, 서점의 역할과 의미를 비롯한 도서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
?
?